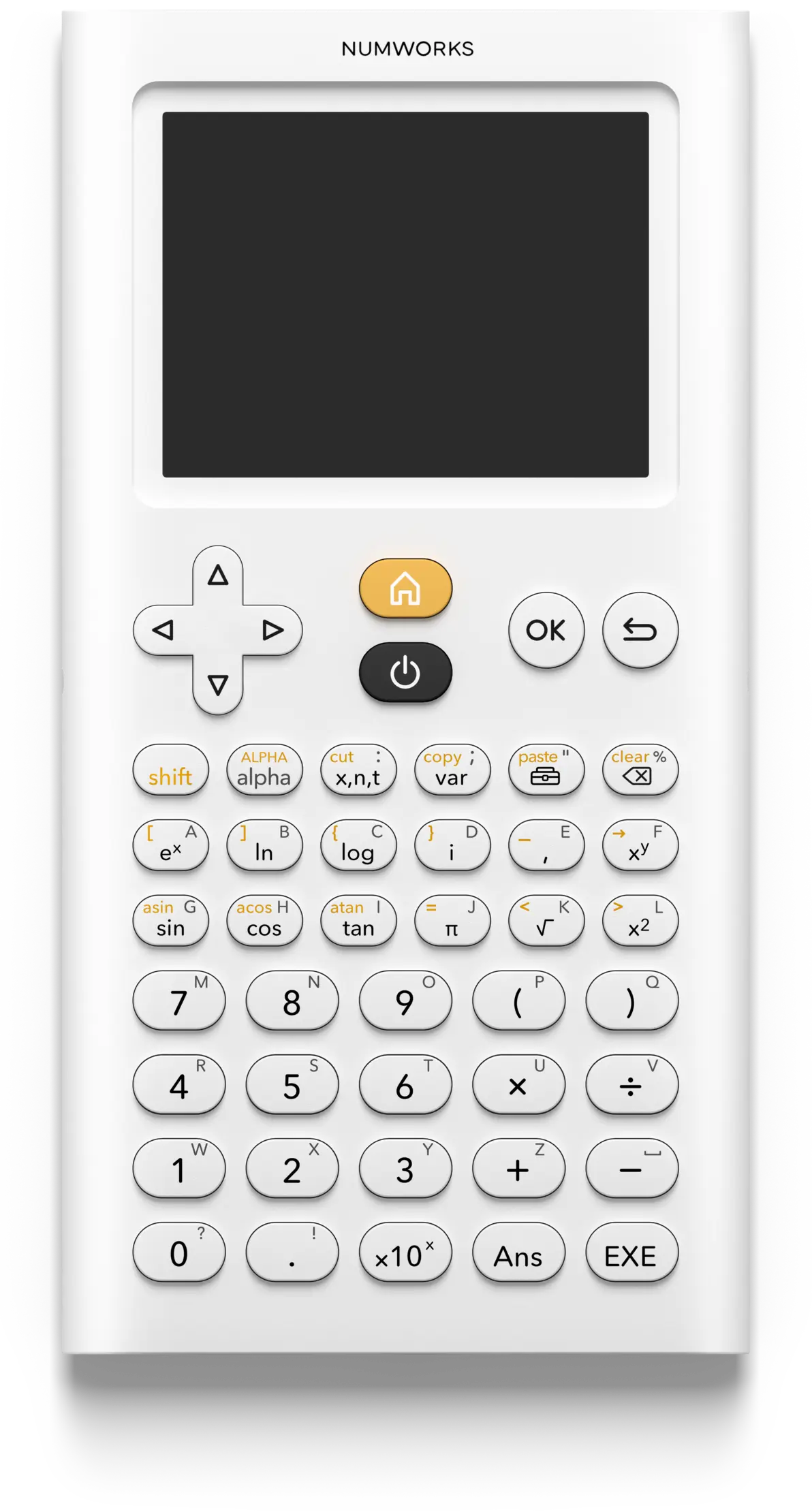알쓸신잡, 지대넓얕, 차이나는 클라스, 어쩌다 어른, 세바시, 문화센터 강연 등 지식토크 혹은 강연이 인기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식에 목마르다는 의미다. 이걸 인문학 열풍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내 나름대로 이런 프로그램들의 특징을 토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지식의 특성이 무엇일지 추려봤다.
1. 어렵지 않을 것. 따라서 수식이 등장할 수 없다.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철학용어도 등장하면 안된다. 그렇다보니 주로 인문학 내용이 다루어진다. 인문학이 쉽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수식은 안나오니까.
2. 친철하고 요약적일 것. 설명하는 사람이 충분히 소화해서 요약해주는 지식이어야 한다. 방대한 지식을 스스로 고군분투해서 습득해야 하는 압축적인 지식전달은 선호되지 않는다. 그런 "공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3. 재미 있을 것. 아무리 쉽고 요약적인 지식이어도 재미가 없으면 선호되지 않는다. 지식을 예능처럼 소비하고 싶어한다.
4. 현학적일 것. 그러면서도 적당히 현학적이어서 이렇게 습득한 지식을 그럴듯하게 풀어 놓았을 경우 남들한테 좀 있어보일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어야 선호된다.
5.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지식일 것. 이렇게 습득한 지식에 대해 시험을 보거나 이 지식을 이용해 자격시험을 봐야 하는 등의 의무가 없어야 선호된다. 의무가 있는 지식은 습득하기 싫어진다.
6. 1~5의 조건이 만족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지식이어도 1~5의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어긋난 고도의 쓸모있는 지식보다 선호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평가"를 수반하는 모든 교육은 사람들이 선호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무리 실용적이고 중요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이게 바로 교육의 근본적인 비극이 아닐까 싶다.
1. 어렵지 않을 것. 따라서 수식이 등장할 수 없다.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철학용어도 등장하면 안된다. 그렇다보니 주로 인문학 내용이 다루어진다. 인문학이 쉽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수식은 안나오니까.
2. 친철하고 요약적일 것. 설명하는 사람이 충분히 소화해서 요약해주는 지식이어야 한다. 방대한 지식을 스스로 고군분투해서 습득해야 하는 압축적인 지식전달은 선호되지 않는다. 그런 "공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3. 재미 있을 것. 아무리 쉽고 요약적인 지식이어도 재미가 없으면 선호되지 않는다. 지식을 예능처럼 소비하고 싶어한다.
4. 현학적일 것. 그러면서도 적당히 현학적이어서 이렇게 습득한 지식을 그럴듯하게 풀어 놓았을 경우 남들한테 좀 있어보일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어야 선호된다.
5.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지식일 것. 이렇게 습득한 지식에 대해 시험을 보거나 이 지식을 이용해 자격시험을 봐야 하는 등의 의무가 없어야 선호된다. 의무가 있는 지식은 습득하기 싫어진다.
6. 1~5의 조건이 만족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지식이어도 1~5의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어긋난 고도의 쓸모있는 지식보다 선호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평가"를 수반하는 모든 교육은 사람들이 선호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무리 실용적이고 중요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이게 바로 교육의 근본적인 비극이 아닐까 싶다.
'가르치는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방대 이야기 (2) | 2018.12.14 |
|---|---|
| 조승모(2017)을 검색하는 학생들에게... (0) | 2018.12.10 |
| 분노의 각인 (0) | 2018.12.05 |
| 우울합니까? (7) | 2018.12.01 |
| 학벌주의와 패배의식 (7) | 2018.11.19 |